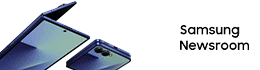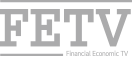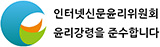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이가람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시장 호황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한 증권사들이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렸다. 총액 기준으로는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평균 금액은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았다.
복리후생비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수당 등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연금 등을 비롯해 유급휴가·식사비·기숙사비·통근 차량 제공·장학금·주택·의료비·경조사비 등의 항목이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증권사 36곳이 올 상반기 동안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4644억7400만원으로 전년(3778억7800만원)과 비교해 22.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32개사가 복리후생비를 확대했다. 부국증권(90.65%)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띈다. 한화투자증권(74.68%), 흥국증권(46.29%), 대신증권(46.08%), BNK투자증권(45.13%), DS투자증권(42.26%), 신한금융투자(32.25%), SK증권(29.82%), KTB투자증권(29.38%), 하이투자증권(27.18%), 삼성증권(25.92%), 메리츠증권(23.73%), 한양증권(23.14%), 미래에셋증권(23.05%), 상상인증권(22.21%), 이베스트투자증권(20.49%) 등도 대대적으로 곳간을 열었다.
반면 축소한 곳은 3개사에 불과했다. 키움증권(-5.59%), 리딩투자증권(-2.20%), IBK투자증권(-2.16%) 등이다. 올 초에 출범한 토스증권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20년 상반기~20201년 상반기 증권사 복리후생비 현황.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 발췌. [자료 금융투자협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935/art_16304714813736_d963c4.png)
이 기간 NH투자증권이 5370만원을 지불하면서 수년째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로 자리 잡았다. 대신증권(5032만원), 한화투자증권(4876만원), KB증권(4368만원), 삼성증권(3377만원), 미래에셋증권(3398만원) 등을 가볍게 따돌렸다. 임직원수가 미래에셋증권(39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보상 내역이 다양한 만큼 복리후생비 규모도 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사옥 이전 등을 통해 최적의 근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연장 근무 보상, PC 오프제, 임신·유산·사산휴가, 불임휴직 도입 등 복지 혜택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반 년 동안 지출한 임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약 102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화투자증권(4203만원)이 식구 챙기기에 앞장섰고, 대신증권(3259만원), NH투자증권(1777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1632만원), KB증권(1516만원), 교보증권(1352만원), 삼성증권(1323만원), SK증권(1288만원), 메리츠증권(1257만원), DB금융투자(1147만원), 신한금융투자(1132만원), 키움증권(1084만원) 등도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신생 증권사인 토스증권도 6억9970만원을 풀었다. 임직원 1인당 63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IBK투자증권(628만원), 하이투자증권(612만원), 흥국증권(601만원), 하나금융투자(455만원), 부국증권(141만원) 등 토스증권보다 몸집이 훨씬 큰 증권사들이 직원 복지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가 전반적으로 직원 복지를 중시하고 있는 추세라 바람직한 복지 문화 구축에 신경 쓰지 않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며 “복리후생비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적용 항목이 다른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와 판매관리비 과목 모두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판매관리비로 산정하는 등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 특유의 고연봉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기조가 보상은 급여와 성과급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복지에 투자할 여력을 직원들의 연봉 실수령액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