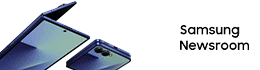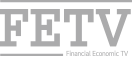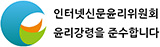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임종현 기자] 중금리 개인신용 대출을 공급하던 P2P금융 기업 렌딧이 영업을 종료했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지 불과 6년 만이다.
온투법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야당, 소수정당을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P2P금융을 제도권에 들여놓고 포용적 금융의 한 축으로 키워보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약속과 다소 거리가 있다.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제도 속에서 오히려 갇혔고 혁신의 에너지는 규제의 벽 앞에서 소진됐다.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불허, 개인투자 한도 제한, 예약거래 금지 등 다층적 규제가 그 벽을 더욱 높였다. 법제화로 투명성과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시장의 자생력을 키울 유인책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냉혹했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위축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온투업 연계대출 잔액은 1조원 내외에서 정체됐고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2019년 237개였던 온투업체 수는 올해 10월 말 51개로 급감했고 이 중에서도 실제로 영업을 이어가는 곳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혁신의 '실험실'이었던 온투업의 순기능이 꺼질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규제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저축은행 2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온투업 대출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시행 6개월 만에 수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시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온투업은 소수 중심의 시장으로 정비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 대출잔액 1500억원을 돌파하며 선도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는 저축은행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카드사, 캐피털사, 보험사 등 전통 금융권과의 연계까지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의 모델을 완성하려는 시도다.
이런 변화가 산업 재편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더 많은 금융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참여하고 중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의 싹이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들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시장 그리고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