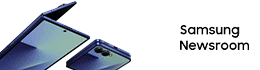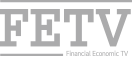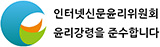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나연지 기자] 산업재해율 0.02%. 누가 봐도 훌륭한 수치다. 포스코가 지난해 본사 임직원을 기준으로 기록한 이 수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경영 사례로 해석될만 하다.
그러나 협력사로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본사보다 훨씬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는 협력사가 다수다.
‘본사는 안전하지만, 협력사는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ESG 공시를 통해 제시하는 재해율 수치는 대체로 양호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협력사 재해율이 본사보다 5~10배 이상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LG, 현대자동차, 한화, 포스코 등 다수의 주요 기업들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0.0X%’라는 수치만을 앞세워 안전 성과를 강조한다. ‘일은 내 일이지만, 위험은 남이 짊어진다’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해율을 본사 임직원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협력사 수치는 별도로 분리하거나 생략하는 방식이라면 ESG 공시는 ‘책임 회피’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재해율 공시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항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업마다 공시 형식과 지표가 달라, 협력사 재해율은 기업 재량에 따라 공개되거나 생략된다. 일부 대기업은 협력사 안전교육을 본사와 통합 운영하거나 전담 조직을 두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드문 사례에 가깝다. 산업안전 공시의 표준화와 법제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에 대응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고 일부는 안전 전담 임원을 신설하며 조직 관리도 고도화했다.
그러나 협력사 관련 지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기업이 협력사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수치의 선택적 활용이다. 어떤 기업은 TRIR(총재해율)을, 어떤 곳은 LTIFR(근로손실재해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내부 보고서에는 두 지표가 모두 담겨 있으면서, 외부 공개 시에는 유리한 지표만 선택적으로 내놓는다.
이제는 안전조차 선택적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일까.
모든 재해가 수치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다. CJ 계열사 산업현장에서 근무했던 한 종사자는 “작은 사고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신고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처럼 ‘통계 밖의 재해’는 어떤 보고서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보이는 수치만으로 안전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숫자는 정제된 결과일 뿐, 그 이면에는 기록되지 않은 위험과 책임이 남아 있다.
기업이 선택하는 수치는, 그들이 책임지는 범위의 크기를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디까지의 책임이 포함돼 있느냐는 점이다.
재해율 통계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 보이지 않는 책임을 덮고 있다. 산업안전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책임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지표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