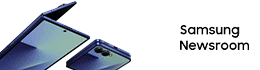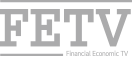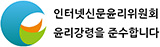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이가람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 증권사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웠던 금융그룹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 M&A 효과를 톡톡히 본 곳으로 NH농협금융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꼽힌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등 증권업계를 선도하게 됐고, NH투자증권은 순조롭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반면 KB증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차이는 실적과 배당에서 발생했다.
2013년 NH농협금융이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우리투자증권을 품에 안았다. 인수가격은 1조1000억원이었다. 당시 자기자본이 8800억원 수준이었던 NH농협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3조4600억원을 흡수하면서 단숨에 자기자본 4조3000억원대 초대형 증권사로 도약했다.
이후 NH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장했다.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60%까지 평균 46%대 성장세를 나타냈다. 대폭 늘어난 자본을 기반으로 투자금융(IB)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NH농협금융에 대한 현금배당도 꾸준히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주주들과 나눈 보통주 배당금은 총 9528억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금융의 지분(49.11%)을 반영하면 약 4679억원이다. 7년 만에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지출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배당으로만 돌려받은 셈이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농업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하면 ‘효자’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의 기여도는 28%로 확인됐다. KB증권(12%)의 두 배로 그룹 내 위상부터 다르다.
2016년 미래에셋그룹은 KDB대우증권의 지분 43%를 확보하는 데에 2조3205억원을 베팅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의 1.3배로 고가 매입 논란이 있었지만 증권사 사관학교로 불리며 존재감을 자랑했던 대우증권의 이름값과 업계 최상위 규모의 자기자본을 얻게 돼 남는 장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6조7000억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다섯 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에 배당한 금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약 1315억원이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주주배정 유상증자(9560억원)와 내부자금(6300억원)과 인수금융(8000억원)을 합쳐 투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쓴 금액은 3300억원 안팎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의 배당성향이 보수적이었지만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은 이유다.
비슷한 시기 KB금융그룹도 뛰어들었다. 현대그룹의 집사 역할을 맡았던 현대증권이 현대상선의 경영 악화로 매각이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KB금융이 비은행계열사 확대를 위해 자회사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을 합병하고자 했다. KB금융은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사들이는데 1조2300억원을 적어냈다. 당시 현대증권의 적정가격은 7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해 출자한 금액을 더하고 현대저축은행 매각대금을 빼면 총 2조4700억원에 달한다.
투자시장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KB증권은 출범 첫해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부침에 배당 규모도 불안정했다. ‘1+1=2’가 아닌 ‘1+1=1.5’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가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단순 합산 기준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순익 규모를 넘어서게 됐다. KB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KB금융이 배당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991억원 남짓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KB증권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2017년 KB금융이 7년 만에 은행 대장주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그 기대에 보답하듯 KB증권은 올해 채권자본시장(DCM)은 물론 주식자본시장(ECM)에서도 선두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역대급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회수율 증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M&A는 단기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 사업이고 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금융시장 내 바뀐 위치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