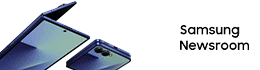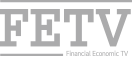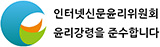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이건혁 기자] 지난 6일,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이벤트를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니라 ‘BTC’로 기입하면서 총 62만개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말이 62만개 비트코인이지 60조원 규모의 금액이 곳곳에 흩뿌려진 셈이다.
빗썸은 오후 7시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한 뒤 20분 만에 사태를 파악했다. 오후 7시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62만개 비트코인 중 61만8214개 비트코인은 회수됐다. 다만 1786 비트코인은 시장에 풀렸다. 매도된 비트코인도 대부분 회수됐다고는 하지만, 시장가가 17% 폭락하는 등 충격이 주변부로 번졌다.
더 큰 문제는 ‘얼마나 회수했느냐’보다 ‘어떻게 지급이 가능했느냐’에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75개였다.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비트코인도 4만2619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빗썸이 보유(및 위탁 보관)하고 있는 수량과 비교해도, 14배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 된다. 실제로 일부 이벤트 당첨자는 이를 현금화했다.
옆집에서 불이 나자 이웃들도 바빠졌다. 두나무, 코인원 등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며 자신들의 거래·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고는 빗썸이 쳤지만, 동종 업계 전체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피해 보상안도 제시했고, 해명도 했으니 이쯤에서 정리될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본격적인 불길은 이제부터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올 초부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됐다. 업계 플레이어 대부분이 대주주 지분율이 30%를 넘는 데다,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은 향후 생존과도 직결되는 만큼 업계 나름의 반발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빗썸에서 사고가 나기 전의 이야기다.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금융위는 사고 다음 날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까지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부터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된 제도개선’까지 논의됐다.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당국의 손에 명분을 쥐어준 꼴이 됏다. 이제 당국에서 어떤 규제를 내놓던 가상자산거래소가 할 말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