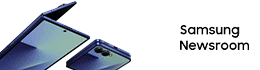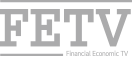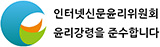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이건혁 기자] “얼마 전에 공지가 내려왔어요. 매년 지급되던 복지포인트를 반으로 깎고, 나머지는 성과급 형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빗썸의 한 직원은 씁쓸하게 말했다. 불만의 핵심은 ‘돈’ 그 자체만은 아니다. 매년 당연하게 이어질 거라 믿었던 복지 제도가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 손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더 민감한 건 ‘시점’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예년만 못한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하반기 대비 12% 감소한 수준이다.
실적도 궤를 같이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의 영업손익은 7446억원에서 6185억원으로 17% 줄었다. 업계 특성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거래규모 둔화는 곧바로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 체감은 더 빠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4분기 들어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띄게 느껴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후 반등 신호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빗썸에게 올해는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시기다. IPO(기업공개) 달성을 위해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절반을 깎은 이번 결정도 여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PO를 앞두고 인건비 감축을 통한 재무 구조 개편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인건비와 같은 고정지출을 줄이면, 거래대금 변동에 따른 실적 흔들림을 완화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아 거래량이 꺾이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구조다. 비용 구조를 가볍게 만들수록 손익분기점은 낮아지고, 시장 반등 국면에서는 이익 레버리지가 커진다.
외부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동요는 별개의 문제다. 옆집 두나무에서 인력을 새로 모집할 때마다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모집군 업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두나무가 네이버와 합쳐진 뒤로 확장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인력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 관건은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입증할 것인가에 달렸다. 임원들의 성과급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만큼 조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부의 희생으로 회사가 어떤 비전을 보일 수 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투자자는 비용 절감에 박수칠 수 있으나 조직은 ‘신뢰’의 균열을 기억한다. 복지의 성과급 전환이 단순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재 이탈의 도화선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IPO를 앞두고 빗썸이 줄여야 할 건 고정비만이 아니다. 불확실한 업황 속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까지 다독이지 못한다면, 가장 비싼 비용은 ‘사람이 빠져나간 뒤의 공백’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