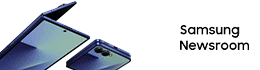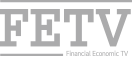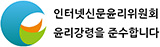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박원일 기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동시에 환경부문을 사실상 정리하면서 사업 구조 재편에 들어갔지만 이후의 전략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공통된 출발점에서 두 회사는 ‘본업 강화’와 ‘업의 전환’이라는 상반된 길을 택했다.
GS건설은 환경사업 철수를 계기로 건축·주택 중심의 전통 사업으로 회귀한다. 브랜드 경쟁력과 정비사업 파이프라인 등 기존 강점을 재정비하며 시장 변동성 속에서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결국 GS건설은 ‘리스크 축소’와 ‘본업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주거 브랜드 ‘자이’의 브랜드가치 상승,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도시정비 수요 증가는 GS건설이 주택 중심 체제로 다시 무게를 싣는 주요 배경이다. GS건설에게 환경부문 정리는 곧 ‘익숙한 영역에서 수익 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에 가깝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환경부문 정리를 계기로 건설사의 틀 자체를 벗어나려 한다. 반도체·배터리·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시설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조를 전면 전환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업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첨단 생산설비 시장의 성장을 기회로 삼아 미국·동남아 중심의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기 안정성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GS건설과는 위험 구조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GS건설은 기존 강점을 활용해 ‘안정과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삼는 반면, SK에코플랜트는 ‘확장과 재창조’를 핵심 기조로 미래 산업 중심의 새 성장축을 구축하려 한다. 환경사업 축소라는 같은 선택 뒤에 두 회사의 목적지는 확연히 갈라진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환경사업의 부담을 덜어냈다’는 사실뿐이다.
결국 건설업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불황 속에서도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체질 개선을 선택했다. 하나는 ‘본업의 깊이’로 다른 하나는 ‘사업의 확장성’으로 생존 전략을 마련했다. 향후 2~3년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