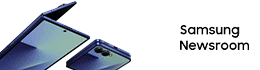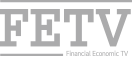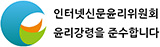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
〈편집자 주〉 국내 부동산신탁업은 14개사가 경쟁하는 427조원대 시장으로 단순 담보관리에서 개발형·책임준공형 신탁까지 외연을 넓혀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규제 강화로 업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의 현주소와 각 사별 전략·리스크·전망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
[FETV=박원일 기자] 한때 ‘효자 상품’로 평가받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부실로 교보자산신탁이 흔들리고 있다. 연이은 적자와 급증하는 부실채권, 악화되는 재무건전성은 결국 신용등급 전망 하락으로 이어졌고 모회사 교보생명까지 위험에 노출되며 그룹 전체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1998년 12월 ‘생보부동산신탁’으로 출범했다.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 대주주 소유주식수 변경을 거쳐 2019년 7월 교보생명이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0년 1월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교보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1년 이후 교보생명·삼성생명이 50:50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신용위험·유동성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입형 개발신탁을 취급하지 않고 담보신탁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9년 교보생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기존의 담보신탁·관리형 신탁 중심에서 차입형·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 중심으로 공격적 확장에 나섰다.
2014년 188억원이던 영업수익은 2019년 669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0억원에서 373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의 공사 지연이나 부도 시 신탁사가 보증을 떠안는 구조로 경기 침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이 속출한 것이다.
이처럼 교보자산신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리스크로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공격적 사업 확장을 통해 급성장했지만 현재는 8분기 연속 적자 등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2년 영업이익률 33.4%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외형·이익 확대를 이어왔지만 2023년부터 영업수익을 초과하는 영업비용 발생으로 적자 전환됐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영업비용이 발생해 영업적자가 300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자본확충에도 불구하고 차입도 크게 늘어 부채비율은 3년 동안 19%→20%→89%로 확대됐다.
![교보자산신탁 실적 및 재무 현황 [자료 교보자산신탁 감사보고서]](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885354428_40f00c.jpg?iqs=0.6864314922761859)
이에 따라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4월 교보자산신탁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상증자,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책임준공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재무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으나 책임준공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PF 원리금 대지급 부담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잠재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비우호적인 업황으로 사업기반이 위축된 점도 부정적 요소로 고려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손상각비다. 2021년 5억원에 불과하던 대손상각비는 2024년 상반기 1084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2577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신탁사의 대출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된 수치로 향후 환입 가능성도 낮다.
자산건전성도 위태롭다. 교보자산신탁의 고정이하자산은 6161억원, 순고정이하자산/자기자본 비율은 48%, 부채비율은 89.4%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충당금도 3644억원을 적립했지만 충당률은 59.1%에 불과해 업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보자산신탁 자산건전성 현황 [자료 한국신용평가 리포트]](http://www.fetv.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885443975_5a3275.jpg?iqs=0.8128870512497768)
이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시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신규 수주 제한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보자산신탁의 개발신탁 신규 수주액은 2022년 1301억원에서 2024년 502억원으로 2년만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부실 사업장 상당수는 시행사·대주단과의 소송에 휘말려 있어 향후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교보자산신탁은 급하게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모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021년 이후 총 6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졌다.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1500억원씩 유상증자가 실행됐으며 2024년에는 1000억원 유상증자와 20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수혈했다.
하지만 근본적 사업 구조나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자금만 투입되는 상황에 ‘계열사 리스크’가 모회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적자가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신뢰 회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이라는 고수익 사업의 그림자는 이제 모회사인 교보생명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단순한 자금 수혈을 넘어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회생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