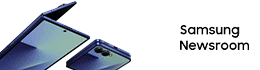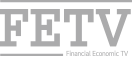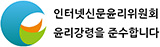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임종현 기자]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이커머스 플랫폼 두 회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오아시스에 인수됐어도 티몬을 향한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지난해 1조원대 미정산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고 환불 등 여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PG업계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재협력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는 그간 티몬에 드리운 불신을 지우기 위해 정상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7월 티몬에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며 직배송 노하우를 이식해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티몬은 물류센터 확보와 노후 시스템 개편으로 내부 체질을 개선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와 익일 정산제 도입해 대외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조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무기한 연기됐지만 당초 8월11일과 9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8월 재개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 영업을 재개하겠다며 한 차례 번복했고 9월엔 변제율에 반발한 피해 소비자들이 제휴 카드사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발됐다.
오아시스는 티몬의 영업 재개가 우선적으로 이뤄진다면 피해를 입었던 셀러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체는 이들만이 아니다. 카드·PG사 역시 티몬의 회생 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을 떠안았다.
물론 법적으로는 오아시스가 티몬 사태로 벌어진 카드·PG사의 불신을 해소할 책임은 없다. 모두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티몬이 정상 운영되려면 셀러뿐 아니라 결제를 책임질 카드·PG사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는 현재 셀러들을 위한 대책만 내놓았을 뿐 카드·PG사를 겨냥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투자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여전히 티몬을 향해 냉담한 이유다.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는 지난달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제는 주주도, 정책도, 시스템도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났다. 달라진 건 경영 주체와 시스템뿐이고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