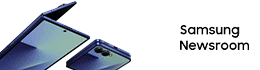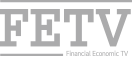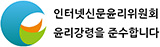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나연지 기자]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 성적표는 언제나 완벽해 보인다. 법정 기한은 지켰고, 결제 수단도 전액 ‘현금성’으로 처리했다. 외형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협력사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진짜 기준은 ‘무슨 수단으로 주느냐’가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다.
현금성 100%는 보기엔 완벽하지만 입금 시점을 보장하진 않는다. 공시의 현금성 지표는 여러 수단을 한데 묶은 총량일 뿐이다. 협력사에 중요한 건 돈의 형태가 아니라 날짜다. 검수 완료일 기준 실제 입금이 30~60일로 밀리면 인건비·원재료 대금을 신용으로 버텨야 한다. 반대로 현금 결제율이 낮아도 10일 이내에 하도급을 지급하면 유동성은 살아난다. 수단보다 타이밍이 본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업종별 온도차도 뚜렷하다. 반도체·IT·자동차·유통 계열은 속전속결이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이노텍, 현대차와 기아는 10일 내 지급률이 70~90%를 넘었다. 협력사가 납품한 지 열흘도 안 돼 대금을 회수한다. 반대로 조선·중공업·플랜트·바이오 계열은 장기 구간이 고착화됐다. SK오션플랜트, HD현대마린엔진, 포스코퓨처엠, 휴젤 등은 대부분의 대금이 30~60일에 걸쳐 지급됐다.
같은 그룹 안에서도 격차는 컸다. 포스코DX·포스코엠텍은 15일 내 지급 비중이 높았지만, 같은 그룹의 포스코퓨처엠은 10일 내 지급이 사실상 없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0일 내 지급률이 96%에 달했지만, 현금 결제율(현금·수표 기준)은 1%에도 못 미쳤다. 반대로 HD현대일렉트릭은 현금 결제율이 99%였지만, 10일 내 지급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LG그룹도 제조 계열은 단기 지급과 현금 결제율이 모두 높았지만, LG헬로비전과 로보스타는 지급이 늦고 현금결제율도 낮았다.
그룹 평균은 늘 우수하지만, 평균의 착시를 걷어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협력사의 생존선은 평균이 아니라 ‘열흘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다. 이 한 줄의 답이 신뢰를 갈라놓는다.
시장의 잣대도 변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여전히 ‘60일 준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ESG 평가사와 투자자는 ‘10일 내 지급률’, ‘30일 이상 구간 축소’, ‘현금 결제율’을 핵심 지표로 본다. 내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이후 단체교섭에서도 형식적 준수가 아니라 실질 유동성 확보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법은 지켰다”는 말만으로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
대기업 입장에선 단기 현금 결제가 운전자금 부담을 키운다. 그러나 협력사 금융비용 절감, 납기 안정, 품질 확보로 돌아오는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 공급망 신뢰라는 프리미엄은 장부에 바로 찍히지 않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치명적인 차이를 만든다.
협력사에게 열흘은 생존선, 대기업에게 열흘은 책임의 최소선이란 인식이 보편화될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