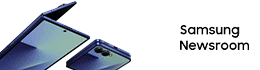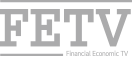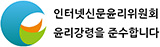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 [편집자주] 금융사들의 기업여신 부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 증가와 함께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까지 이어지면서 리스크 관리의 난이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이에 FETV는 주요 금융사별 기업여신 현황과 중책을 맡은 담당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FETV=권현원 기자] 20개 국내은행(시중 7개·지방 5개·인터넷 3개·특수 5개)의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기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부실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 높아졌다. 최근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더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대한 고심이 깊어졌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14.8조원…비율도 매년 상승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2년 말 10조1000억원이었던 부실채권은 2023년 말 12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역시 ▲1분기 13조4000억원 ▲2분기 14조4000억원 ▲3분기 14조5000억원 등으로 매 분기마다 가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5조원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중 기업여신 부실채권의 비중이 더 컸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11조7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의 경우 같은 기간 5000억원 증가한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 기간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967573417_3810a5.jpg)
총여신 중 부실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부실채권 비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22년 말 0.40%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상반기 0.53%에 도달했다. 기업여신,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각각 0.65%, 0.29%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우상향했다.
특히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 상승이 가팔랐다. 대기업 비율의 변화 추이는 ▲2022년 말 0.49% ▲2023년 말 0.50% ▲지난해 말 0.41%였으나 같은기간 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0.53% ▲0.64% ▲0.78%였다.
부실을 대비하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같은 기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충당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으나 그동안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최근 몇 년간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2022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7.2%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초까지 20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지난해 말 187.7%까지 내려앉았다.
◇美 상호관세에 기업 여신 관리 부담 가중
기업여신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서 은행에 추가적인 부담감까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일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 수익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주요 은행들은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대상들을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건전성 관리와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역시 약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권은 즉각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총 6조3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신한금융그룹은 10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KB금융그룹도 KB국민은행을 통해 8조원 규모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우리금융그룹 역시 '상호관세 피해 지원TF' 회의를 개최하고 관세충격이 큰 수출입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본연적인 역할 자체가 유동성 공급이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지 않는 것은 그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리스크 부담 등 동전의 양면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출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