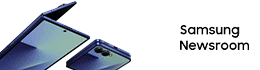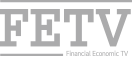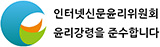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KT 구현모 사장[사진=KT]](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3/art_15973896747733_a58b56.jpg)
[FETV=송은정 기자]KT가 글로벌 미디어그룹 넷플릭스와 손을 잡자 이곳 저곳에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KT와 넷플릭스의 연합군(?)을 반발하는 곳은 미디어 컨텐츠를 담당하는 방송PD단체와 언론노동단체, 방송협회 등이다. 한국PD연합회와 한국방송협회는 12,13일 이틀 연속 공동성명을 내고 KT와 넷플릭스간 업무제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가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KT와 넷플릭스 제휴는 한국 미디어 생태계 교란의 신호탄"이라며 공개 비판한 뒤 "이제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정부의 OTT 글로벌 사업자 육성 의지와는 무관하게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언론노조·PD연합회는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와의 협력보다 2위 사업자를 따돌리려는 KT의 욕망이 국내 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넷플릭스와 만나 이용사·시민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KT는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유율 규제 완화를 이용해 가입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 넷플릭스와 제휴함으로써 국내 OTT와 글로벌 OTT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와 넷플릭스의 제휴는 이후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또 다른 글로벌 OTT 자본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 통신 기업이 보여줄 행보의 신호탄"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상파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KT는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와 넷플릭스의 제휴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붕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들이 'KT-넥플리스' 연합군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주된 내용이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콘텐츠 제작사들은 앞다퉈 넷플릭스에 기획안을 보내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를 모시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이로 인해 넷플릭스가 급등시킨 출연료와 작가료 등 제작 요소 비용으로 기존 미디어들은 제작하면 할수록 손실만 커지는 기현상에 갇혔고 미디어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KT에 ▲자신의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재인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과 ▲탐욕을 버리고,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철회할 것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을 즉각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KT, 넷플릭스와의 섣부른(?) 제휴 우려감 팽배=넷플릭스의 입장에서 KT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자일 수 밖에 없다. KT는 국가기관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된 1위 사업자이다.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봤을땐 KT와 손잡는 게 가장 한국 미디어 시장을 잠식하데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인 셈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K-콘텐츠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각 사가 여러 제휴를 통해 토종OTT가 커지는 것이 걸림돌이다. 국내 토종 OTT가 자리잡기 전에 시장 선점을 해야하는 것과, 국내 토종OTT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야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임무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무엇보다 KT와의 계약이 시급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디지털뉴딜 정책을 펼치자 이와 맞물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가 필요했던 것. "KT가 최근 LG유플러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KT와의 제휴가 다른 통신사에 비해 플러스 효과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손해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SK와의 망 사용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내 기업에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망을 사용 했을때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이 법의 주된 골자다. 이 '안정성' 을 위해서는 중간 사업자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망 사용 댓가든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책임이 있다고 법이 명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다.
넷플릭스는 이번 KT와의 제휴를 통해 정부와 국내 시장을 압박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제휴 이후 정부가 망 사용료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이 생기면 미국에서 자사 기업 보호를 위해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사정기관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이 법을 제정하며 시행령을 만드는 곳에 미 대사관이 자주 전화해 확인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통상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이라고 불리는 망 사용료 법안이 국가간의 이슈로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넷플릭스가 미국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콘텐츠는 외부에서 소싱하면 된다?"...넷플릭스 종속 우려 팽배=코로나19로 '언택트' 현상이 시작되면서 콘텐츠사업자들은 언택트 수혜로 방송 컨텐츠 소비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컨텐츠의 실질적 소비는 넷플릭스에 쏠리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협회나 한국PD연합회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이들은 방송 컨텐츠 시장이 넷플릭스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제작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영향이 커지는것을 우려하고 있다.
KT의 이같은 제휴는 전체 시장의 흐름보다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신업계의 관측이다. 즉., "콘텐츠는 외부에서 소싱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KT는 1,2위 사업자인 SKT, LG유플러스가 올라오는 걸 차단하려는 명목으로 '가입자를 유지시켜 1위를 점유한다'는 인식이 적극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시장은 네트워크, 플랫폼, 컨텐츠 등 3종으로 분류된다. 예전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놓고 경쟁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다. 특히 플랫폼-컨텐츠를 같이 가진 넷플릭스란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는 위험한 요소다.
현재는 콘텐츠와 네트워크가 같이 가는 구조인데 넷플릭스는 어느 사업자건 플랫폼도 경쟁 사업자이고 컨텐츠도 경쟁 사업자인 셈이다. 초기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 제휴 상황을 돌아보면 네트워크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고,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개념이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1,2위 사업자인 KT와 SKT를 따라잡기 위해서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KT와 넷플릭스와의 제휴는 단기적인 수익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다. 넷플릭스가 영향력이 커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토종 OTT 막기 위한 넷플릭스의 공격적 행보…토종기업 공전전선 통한 시장방어 지적=토종 OTT는 경쟁 구도 아닌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진행될 수록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가져가고 네트워크도 많이 차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에 "KT가 글로벌 공룡이 국내 시장 진출을 손쉽게 해줬다", "KT가 배신을 때렸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신사들이 힘을 합쳐서 글로벌 공룡에 대항했다면 어땠을까? 일각에서는 KT 구현모 사장이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두고 '섣부르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KT와의 제휴에서 "한국법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6개월내 제정될 시행령에 담기는 셈이다. 우선, 시행령이 나온 뒤 제휴하는게 합리적인 처사다. KT는 망 사용료 댓가를 받는다는 계약을 했어야 했다.
넷플릭스는 토종 OTT를 막아야 자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국내 법안에도 반하는 결정인 셈이다. 국내 기업들이 합심해 K-콘텐츠 끼리 모이면 분명한 파워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사들의 합심은 누구보다 어려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