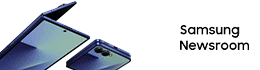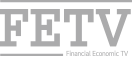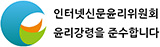[FETV=김진태 기자] 운항중 출입문이 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아시아나항공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당시 관제탑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사건에서 시장과 회사 측이 사고 당시 미흡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 관제(대구국제공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다. 관계기관은 사고 30분이 지나서야 해당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국토부 중간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이모씨는 오후 12시 37분경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빨리 내리고 싶다는 게 문을 연 이유였다. 문을 열 당시 항공기는 약 213m(7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다. 이모씨가 비상 출입문을 열면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6명은 호흡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미흡한 대처다. 당시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이 열린 이후 이씨는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는 시도를 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막으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자칫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유야무야 끝날것 같았던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지휘가 아닌 이모씨의 자백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자백한 뒤 다른 탑승객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무장(보안승무원)을 통해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관계기관은 이때서야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항공기를 운행한 기장이 회사에만 사실을 알린 채 대구공항 관제탑엔 알리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도 관계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운항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떤 이씨는 경찰 체포 직전까지 청사 외부 벤치와 흡연실을 자유롭게 움직였다. 아시아나항공의 미흡한 대처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승객이 문을 연 범인으로 의심한 지상직원이 지속적으로 해당 승객을 인솔하며 관찰·감시 후 범인임을 확신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은 "돌발상황에서는 기장이 관제탑에도 보고해야 했다"며 "항공기 ‘운항 중’에는 다양한 메뉴얼이 있지만 이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는 없다. 특수 상황에 맞는 메뉴얼을 조속히 만들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구공항에 관련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장은 승객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해 빠르게 승객들을 내리는 데 집중했다"며 "회사 측도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